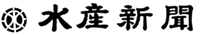시험전 절대 금식
“미역국 먹다” 시험에 떨어지다

“고래가 새끼를 낳으면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미역을 뜯어먹는 것을 본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인다”는 얘기가 ‘초학기(初學記)’라는 문헌에서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풍습을 기록한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서도 “산모가 첫 국밥을 받기 전에 산모 방의 남서쪽을 깨끗이 치운 뒤 쌀밥과 미역국을 세 그릇씩 장만해 삼신상을 차려 바쳤는데 여기에 놓았던 밥과 국을 반드시 산모가 먹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에는 으레 ‘첫국밥’이라 부르는 미역국과 흰쌀밥을 먹는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미역국 먹다”란 게 있다. 이 말은 “해고(解雇) 당하다”와 “시험에 떨어지다”는 두가지 의미로 쓰이는 관용어라 할 수 있는데 미역은 원래 미끈미끈한 것이 특징이다.
미끈미끈한 촉감이 주는 선입견 때문에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역국 먹다”는 말이 처음부터 이러한 의미로 쓰인 건 아니었다.
1957년 한극학회가 발간한 큰사전에는 “미역국 먹다”를 지금의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무슨 단체가 해산되거나 또는 어디에서 떨려나오는 것을 이르는 변말’이라고 설명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한말 일제 침략자들이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당시에는 대단히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해산이란 말을 직접 쓰지 못하고 한자어는 달라도 소리가 같은 해산(解産)으로 대신했고 여기에서 연상되는 “미역국 먹다”는 말로 그 뜻을 전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역국 먹다”가 “해산당하다”는 뜻의 은어가 된 셈이다.
이밖에도 허리가 굽은 사람을 해산미역의 모양에 빗대 “해산미역 같다”고 놀리며 부르기도 했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 젖히는 소리, 내가 세상에 첫선을 보이던 바로 그날이란다” 어느 대중가요의 노랫말처럼 우리 인간은 온 동네 떠나갈 듯 고고성(呱呱聲)을 내며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 날은 어머니의 입장에선 출산일(出産日)이지만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선 ‘귀빠진 날’이라 부르는 생일(生日)이다.
예로부터 산후와 생일날하면 으레 미역국이 연상되리만치 미역과 우리 민족은 친숙한 사이다.
이러한 풍습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에는 으레 ‘첫국밥’이라 부르는 미역국과 흰쌀밥을 먹었으며 자극성 있는 조미료나 굳은 음식도 금하였다. 또한 산모에게 먹일 미역은 값을 깍지도 않았으며 미역 오리를 꺽지 않고 주는 풍습도 있었는데, 값을 깍으면 태어날 아기의 수명이나 복이 깍이고, 꺽어서 주면 난산을 한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산후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그렇다고 친다면 생일을 왜 ‘귀빠진 날’이라 했을까?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머리, 특히 이마 부분이 나올때이다.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 “힘주세요”하는 때이고 이 때가 산모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다. 이마만 무사히 빠지면 연이어 귀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순풍이다.
다시 말해 귀가 빠졌다는 것은 가장 힘든 고비를 넘겨 아기를 낳게 됐다는 것으로 ‘태어나다’는 의미와 함께 귀가 빠진 시점은 정확한 출생시각을 나타내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 따라서 ‘귀빠진 날’ 미역국 먹는 것은 자신을 낳느라 고생하신 어미니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