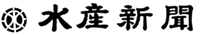고래등 같다
솟을 대문이 있는 크고 넓은 집
고래는 제 몸의 젖을 새끼에게 먹여 기르는 포유동물이지만 수중생활을 하는 탓에 물고기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폐호흡을 하고 자궁에서 새끼가 자라며 배꼽이 있는 특징은 태고시절 포유동물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고래와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친숙한 사이였다.
한반도의 동해는 한때 중국에서 ‘고래가 많이 나는 바다’라는 뜻의 ‘경해(鯨海)’라 불렸을 정도로 고래가 많았다고 한다.
울산 태화강 상류에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에는 이를 증명하듯이 다채로운 고래 그림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
깍아지른 절벽 바위 면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그려 놓은 많은 동물 그림 중에서도 고래의 모습은 참으로 생동감이 넘친다.
물을 뿜는 모습, 심장 부위에 작살이 꽃혀 괴로워하는 모습, 어미 고래가 아기를 업고 가는 모습, 배를 탄 사람들이 뒤집어진 고래를 끌고 있는 모습 등이 그러하다.
이들 고래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과 가장 친숙했던 고래는 모성애가 강한 귀신고래로 몸길이가 15m가 넘고 체중이 40여톤에 이르는 대형 고래다.
재미있게도 귀신고래란 이름은 겁이 많아 포경선이 나타나면 귀신처럼 달아난다고 해서 붙여졌다. 그러나 이처럼 겁이 많은 귀신고래도 새끼를 건드릴라치면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포경선을 공격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이놈을 악마고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친군한 고래는 생활속에서도 갖가지 말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솟을대문이 있는 크고 넓은 집을 “고래등 같다”고 하고 기름진 논은 ‘고래실(고래답)’이라고 한다.
또한 강한 자들의 싸움에 끼여 약자가 피해를 볼 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고 기대했던 바와 달리 성과가 없을 때는 “고래 그물에 새우가 걸린다”고 한다.
반면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말도 있다.
남의 싸움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해를 입거나 아랫사람들 싸움으로 윗사람이 변을 당할 때 쓰는 말이다.
고집이 무지하게 센 사람을 두고 ‘고래 힘줄(심줄)같은 고집’이라 말하기도 한다. <김은경>